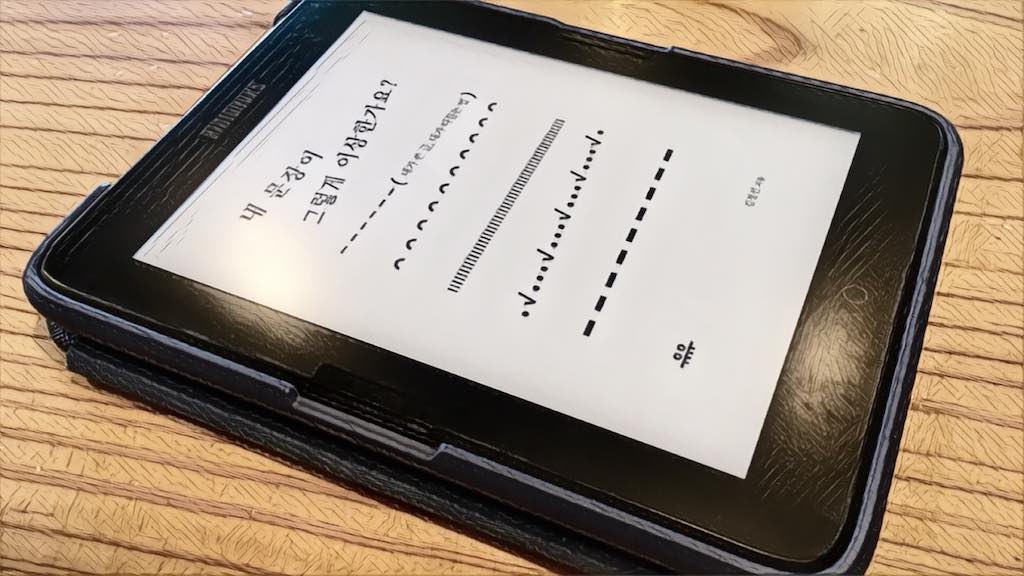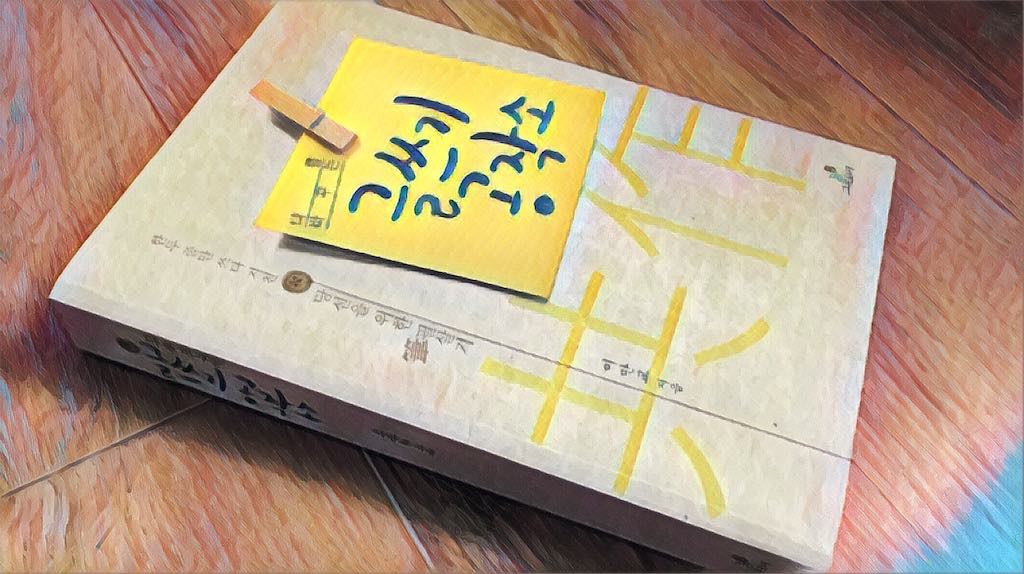내 문장이 그렇게 이상한가요? (김정선, 2016) 독후감
주의해야 할 표현과 소설 같은 이야기가 번갈아 가며 나온다. 문법책처럼 딱딱하게 주의해야 할 표현만 계속 나왔으면 지루했지 싶다. 이야기도 허투루 쓰지 않았다. 훌륭한 예문 그 자체였다. 막힘없이 읽힌다.
문제는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쓰는 데 있다. 어떤 표현은 한번 쓰면 그 편리함에 중독되어 자꾸 쓰게 된다. ’적·의를 보이는 것·들’이 대표적이다. 그러니 아예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, 내가 그 편리함의 중독자인지 살피라는 것뿐이다.
더구나 ’맞선’, ’향한’, ’다룬’, ’위한’ 등등의 표현들로 분명하게 뜻을 가려 써야 할 때까지 무조건 ’대한’으로 뭉뚱그려 쓰면 글쓴이를 지적으로 게을러 보이게 만들기도 한다.
동의한다. 정확한 표현은 지적으로 부지런해야 쓸 수 있다. 무안단물 같은 표현 하나를 알게 되면 대충 아귀만 맞으면 생각을 멈추고 대충 써 갈긴다. 게을러질수록 뭉뜽거린 표현을 즐겨 쓴다. 더 게을러진다면 글조차 쓰지 않겠지.
한글 문장은 영어와 달리 되감는 구조가 아니라 펼쳐 내는 구조라서 역방향으로 되감는 일 없이,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계속 풀어내야 한다. 영어가 되감는 구조인 이유는 관계사가 발달했기 때문이다
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문장의 주인이 문장을 쓰는 내가 아니라 문장 안의 주어와 술어라는 사실이다. 문장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고 글을 쓰면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넘어가게 되거나(왜냐하면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), 문장의 기준점을 문장 안에 두지 않고 내가 위치한 지점에 두게 되어 자연스러운 문장을 쓰기가 어려워진다.
내가 쓰는 문장의 주인에게 나 또한 적당한 거처를 마련해 주고 성격도 부여해 주고 할 일도 만들어 주어야만 한다. 그래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온전하게 펼쳐지는 글을 쓸 수 있다.
글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쓴다. 선문답 같은 이 문장을 뒤에 이르러서야 이해했다.
기억에 남는 문장
- 기왕이면 재미있게 읽히도록 한쪽에 소설 같은 이야기를 곁들였다. <동사의 맛="">에서 쓴 꼼수를 다시 쓴 셈이다. 서너 번 정도 시도하면 꼼수가 아니라 새로운 형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려나.
- ’적·의를 보이는 것·들’ 접미사 ’–적’的과 조사 ’–의’ 그리고 의존 명사 ’것’, 접미사 ’–들’이 문장 안에 습관적으로 쓰일 때가 많으니 주의해서 잡아내야 한다는 뜻으로 선배들이 알려 준 문구였다
- 문제는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쓰는 데 있다. 어떤 표현은 한번 쓰면 그 편리함에 중독되어 자꾸 쓰게 된다. ’적·의를 보이는 것·들’이 대표적이다. 그러니 아예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, 내가 그 편리함의 중독자인지 살피라는 것뿐이다.
- 저자나 역자, 곧 글쓴이가 확신의 편에 서는 사람이라면, 나 같은 교정자는 의심의 편에 설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다
- 자기 글에서 이상한 부분을 빠짐없이 짚어 낼 만큼 완벽하게 객관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 드물다. 글을 쓰기 전부터 머릿속에서 수도 없이 문장을 궁글린 데다 쓰고 나서도 여러 번 읽었을 테니 자연스레 눈에 익게 되고 마음에도 익게 된다. 확신의 편에 설 수밖에 없는 이유다.
- 차라리 없느니만 못하다면 괜한 짓을 하는 것 아닌가. 한 글자라도 더 썼을 때는 문장 표현이 그만큼 더 정확해지거나 풍부해져야지, 외려 어색해진다면 빼는 게 옳다.
- 문장의 주인은 문장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문장 안에 깃들여 사는 주어와 술어다. 주어와 술어가 원할 때가 아니라면 괜한 낱말을 덧붙이는 일은 삼가야 한다.
- 더구나 ’맞선’, ’향한’, ’다룬’, ’위한’ 등등의 표현들로 분명하게 뜻을 가려 써야 할 때까지 무조건 ’대한’으로 뭉뚱그려 쓰면 글쓴이를 지적으로 게을러 보이게 만들기도 한다.
- 말하듯이 글을 써야 자연스럽게 읽혀서 좋다고들 하지만, 여기서 ’말하듯이’는 구어체로 쓰라는 뜻이지 말로 내뱉는 대로 쓰라는 건 아니다. 말은 말이고 글은 글이다. 말에는 말의 법칙, 곧 어법이 있고 글에는 글의 법칙, 곧 문법이 있다. 지켜야 할 규칙이 엄연히 다르다.
- ’–에 의한’과 ’–으로 인한’도 다양한 표현이 들어설 자리를 꿰차고 앉아 터줏대감 노릇을 하는 꼰대 같은 표현들이다.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이분법적인 사고에 사로잡힌 채 늘 똑같은 말만 되뇌는 존재를 꼰대라고 한다면 말이다. 아예 쓰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습관처럼 반복해서 쓰는 일은 피해야겠다.
- 모든 문장은 다 이상합니다. 모든 사람이 다 이상한 것처럼 말이죠. 제가 하는 일은 다만 그 이상한 문장들이 규칙적으로 일관되게 이상하도록 다듬는 것일 뿐, 그걸 정상으로 되돌리는 게 아닙니다. 만일 제가 이상한 문장을 정상으로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면, 저야말로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?
- 이렇듯 ’–로부터’는 대개 ’–에게’, ’–와(과)’, ’–에서’로 나누어 써야 할 표현을 하나로 뭉뚱그려 대신한 것이다. 이러니 습관이고 중독이라고 할 수밖에 없잖은가. 따로 생각할 필요 없이 무조건 하나로 쓰면 되니 얼마나 편리한가. 그 편리함이 주는 유혹은 문장이 어색해지는 걸 꾹 참아 내게 할 만큼 크다.
- 어차피 안구 건조증 때문에 눈이 금세 피로해져서 일도 예전만큼 못 하는 처지니 한번 먹어 볼까 싶어 얼른 돈을 치르고 비타민을 받아 나왔다. 청년으로 약국에 들어갔다가 노인이 되어 나온 기분이었다.
- 모두 한자어 명사에 ’–시키다’를 붙여 동사를 만들었다는 점이다. 한자어에는 ’–하다’보다 ’–시키다’가 더 어울려서일까? 아니면 무엇이 됐든 직접 하기보다는 시키는 게 그럴듯해 보여서일까?
- 혹은 하대를 해도 무방한 상대에게 높임말을 쓸 때. “여보, 안녕히 잘 가시게.” 이럴 때 높임을 뜻하는 선어말 어미 ’–시–’는 ’시’詩가 되기도 한다.
- 지시 대명사는 꼭 써야 할 때가 아니라면 쓰지 않는 게 좋다. ’그, 이, 저’ 따위를 붙이는 순간 문장은 마치 화살표처럼 어딘가를 향해 몸을 틀기 때문이다. 특히나 ’그, 이, 저’가 한 문단에 섞여 쓰이면 문장은 이리저리 헤매게 된다.
- ’여기, 저기, 거기’는 글쓴이가 손가락질하는 것처럼 보여 보기 좋지 않다. 다시 말하지만 문장의 중심점은 문장 안에 있지 문장 밖 글쓴이에게 있지 않기 때문이다.
- 한글 문장은 영어와 달리 되감는 구조가 아니라 펼쳐 내는 구조라서 역방향으로 되감는 일 없이,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계속 풀어내야 한다. 영어가 되감는 구조인 이유는 관계사가 발달했기 때문이다
-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문장의 주인이 문장을 쓰는 내가 아니라 문장 안의 주어와 술어라는 사실이다. 문장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고 글을 쓰면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넘어가게 되거나(왜냐하면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), 문장의 기준점을 문장 안에 두지 않고 내가 위치한 지점에 두게 되어 자연스러운 문장을 쓰기가 어려워진다.
- 내가 쓰는 문장의 주인에게 나 또한 적당한 거처를 마련해 주고 성격도 부여해 주고 할 일도 만들어 주어야만 한다. 그래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온전하게 펼쳐지는 글을 쓸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