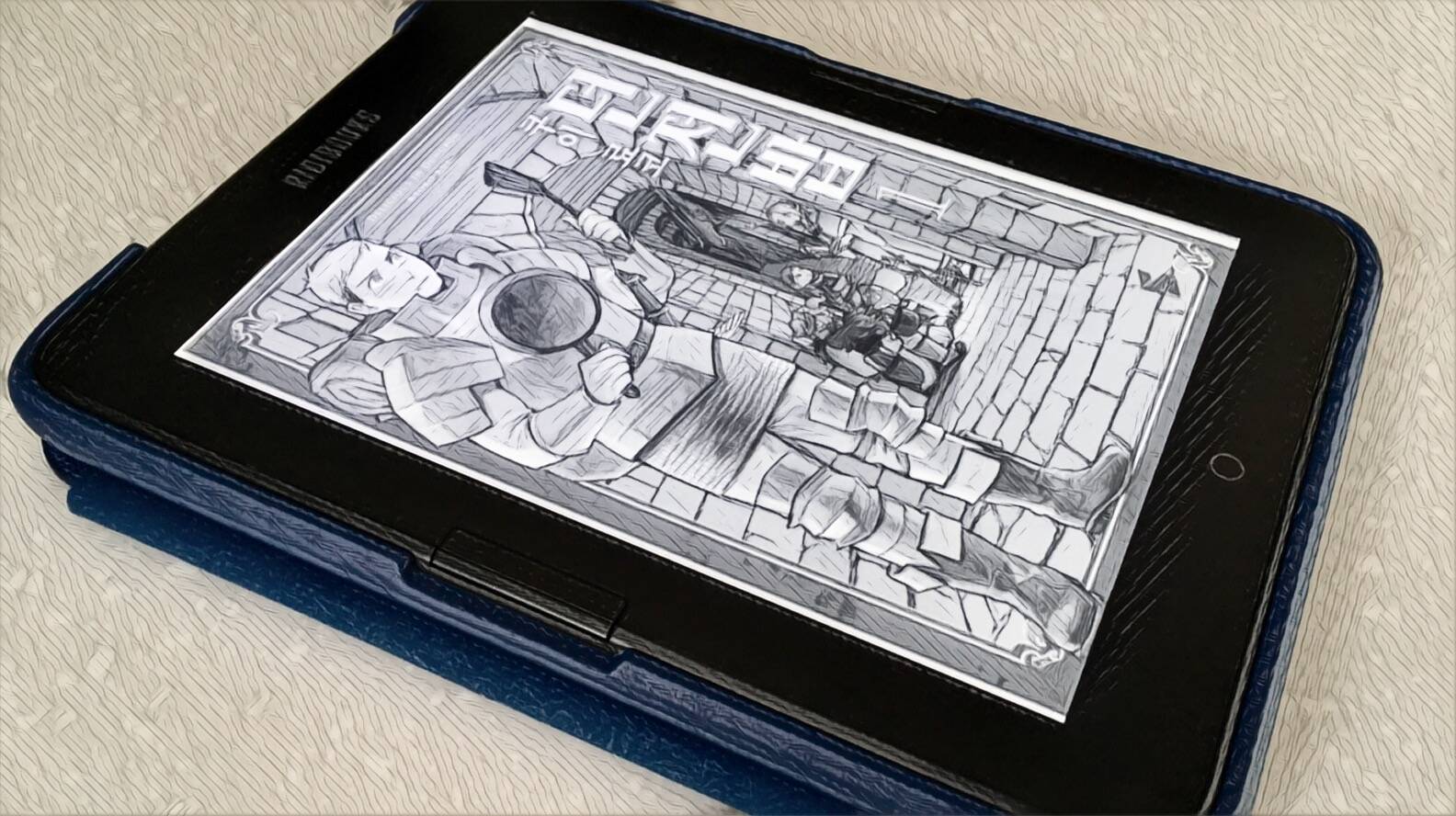34세 무직씨 (이케다 타카시, 2014-2017) 감상문

지난 달 다니던 회사가 없어졌다. 취직 자리를 알아봐주겠다는 얘기도 없진 않았지만 이런저런 생각하는 바가 있어 일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기로 했다.
하루를 잔잔하게 보여준다. 하긴 무직이니깐. 아침에 일어나서 밥해서 먹는다. 청소하고 책 읽다가 낮잠 잔다. 빨래하고 저녁 장보고 뭐 이런 일상이다. 약속이나 이벤트가 생기면 외출하고. 지루하고 뻔해 보이지만 계속 보게 된다. 익숙함에서 얻을 수 있는 편안함 때문인 것 같다.
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든 것이냐? ’EBS 다큐프라임 동과서’ 다큐멘터리에 나온 것처럼 문화가 코딩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것일까? 이웃집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 물었을 때, 아무것도 안 하고 쉰다고 얘기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둘러대는 장면이 안타까웠다. 무직이라고 당당하게 왜 말을 못 해. 하긴 나라도 못할 것 같긴 하다. 능력이 없어 보일까 봐 두려울 것 같다. 내 얘기를 한다고 해도 수많은 잡담거리 중 하나일 뿐이고 금방 지나가 버릴 거다. 이런 걸 두려워해서 다른 사람 신경을 쓰기엔 인생이 짧다. 그래도 문화가 하드코딩한 주변 사람 신경 쓰기는 어떻게 삭제 한다냐.